vs의 또 다른 본질: 적의 확립
커뮤니티에서 적을 가진다는 것은 유저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유저의 가치 체계를 측정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그것에 맞서는 장애물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적이 없다면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폭넓은 유연성을 지니는데
흥미로운 점은,
자기를 위협하는 적을 거의 자연적인 현상의 측명에서 규명하는 일이 아니라
그 적을 만들어 내서 악마로 만드는 과정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과 달리 서커스와 극장 등을 들락거리고
시끌벅적한 축제를 벌인다는 이유로 그들을 비난했다.
적들은 언제나 자기와 '다르고' 우리와는 다른 관습에 따라 행동하는 법이다.
다름의 완벽한 예시는 외국인이다. 서구문명의 요람인 그리스~로마 시기의 부조를 보면
야만인들은 수염이 덥수룩한 들창코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barbarian, 이방인이란 말의 어원 그대로 언어 능력의 결여, 사고의 결여,
그들의 무지와 몰상식함을 암시하는 상징물이 많다. 마치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인들처럼.
'바지'를 입는 그들의 야만성에 대한 문헌도 많이 보인다 ㅋㅋ
반대로 그 '야만인'들도 그들을 치마나 입는 계집들이라고 생각했다.
타키투스는 유대인을 이렇게 묘사한다.
'우리에게 신성한 모든 것은 그들에게 불경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결한 것은 그들에게 허용된 것이다.'
불과 백년 전까지만 해도
흑인들은 나태, 배반, 복수, 잔학, 절도, 거짓, 외설, 방탕, 불결, 방종 등의 악습을 가지고 있다고
'백과사전'에 버젓이 명시되었다.
이방인들은 추하다.
아름다움은 곧 선함과 같은 것이기에 적은 불선, 추해야 한다.
서구의 역사가들이 묘사한 아틸라의 모습이
흔히 연상되는 악마의 그것과 놀랍도록 흡사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적은 이곳 내부에 있기도 하다.
이들은 색다르고 추악한 인물상으로 그려진다.
테르시테스가 그렇고 에피알테스가 그렇다.
적들은 그 추악함 만큼이나 냄새나는 족속들이기도 하다.
급식시절,
우리 곁을 지나치는 일찐들이 항상 하던 말을 상기해 보자.
"아 냄새 시발 무슨냄새냐 이거?"
우리는 그들에게 추악한 존재이기에
냄새라는 형태의 심상으로 그들의 혐오감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1차대전 당시 프랑스의 어떤 심리학자는
독일인들은 프랑스인보다 똥도 많이 싸는데다
그 똥은 더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똥이라는 썰을 진지하게 풀고
출판까지 했다 ㅋㅋ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류는 문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적의 형상을 지워내는데 실패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온순한 사람에게도 적의 필요성은 본능적이다.
이 경우 적의 이미지는 인간이라는 대상에서 자본주의 착취나 환경오염,
제 3세계 빈곤 문제 등을 비롯한,
우리를 위협하고 망가뜨리는
자연적인 힘이나 사회적인 힘으로 표현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름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이자
우리의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며
적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시인이나 성인, 변절자들의 특권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현존을 통해
비로소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공존과 순응의 규율들이 세워진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서 못마땅한 구석을 더 쉽게 발견한다.
그들은 우리와, 너는 나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만들고 지상에 산 자들의 지옥을 건설한다.
타인이 곧 지옥인 것이다.
이상임
 보상
24년 수능 보상을 지급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세히보기]를 누르시면 수령 가능합니다.
보상
24년 수능 보상을 지급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세히보기]를 누르시면 수령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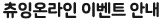 이벤트쓰
[11월4주차] 유니크뽑기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참여하기]를 누르시면 비로그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유니크당첨 기회를 노려보세요!
이벤트쓰
[11월4주차] 유니크뽑기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참여하기]를 누르시면 비로그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유니크당첨 기회를 노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