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
서장 –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
나의 가장 낡고 오래된 기억은 거대한 불꽃이었다. 그것은 불타오르는 집과 나무들로 눈이 부실 정도였다. 짐승의 울음소리와 절그럭거리는 쇳소리에 나는 인상을 찌푸렸던 것 같다. 누군가 반복하여 읊는 기도문들이 어째선지 신경질적으로 느껴졌다. 어둑한 밤하늘을 향해 나무 기둥들이 솟아올랐다. 하늘에는 날카롭고 차가운 초승달이 떠 있었다. 매캐하고 야릇한 냄새가 내 코를 간질였다. 그것이 나의 최초의 기억이었다.
그 때의 나는 몇 살이었을까. 이렇게 불꽃을 보고 있으면 그 날의 기억이 더욱 생생해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제님. 저기ㅡ, 가스펠 사제님?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감상에 젖어있던 나는 정신을 차렸다.
“아, 프란시스 사제님. 별 일 아닙니다. 마저 일을 끝내도록 하죠.”
걱정스러운 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프란시스 사제를 향해 나는 잔잔히 미소를 지었다. 프란시스는 배를 어루만지며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하하, 어서 그러시죠. 마침 배가 고파지던 참입니다. 일이 끝나시면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마침 괜찮은 가게를 알아냈거든요. 주인장이 직접 눈앞에서 통으로 돼지를 구워내는데 그 솜씨가 여간 대단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어디냐면…”
젊은 사제 프란시스는 한번 입을 열면 무척이나 말이 길어지는 버릇이 있었다. 더 이상 일이 지체되면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나는 적당히 맞장구를 쳐 말을 끊었다.
“그거, 좋겠군요. 그럼 얼른 마무리하도록 하죠. 프란시스 형제님.”
프란시스는 머리칼을 짧게 자른 뒤통수를 멋쩍게 긁적였다. 곧 프란시스는 진지한 얼굴로 품 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아 예, 그럼 판결문을 읽겠습니다. 으흠, 아, 아, 죄인, ‘깊은 숲 마을의 아리아’는 배덕과 사교의 앞잡이로 옳지 못한 일들을 행했으며 많은 사술로 신자들을 현혹시켰다. 이는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허나 자신에게 마녀의 죄가 있음을 자백하고 회개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에 성황청은 마녀 아리아에게 자비를 내리는 바이다.”
프란시스는 두루마리를 군중들 앞에 세워진 나무 기둥의 밑 둥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그리고 낮고 엄숙하게 말했다.
“자, 장작과 횃불을 가져와라!”
마을 광장이 크게 술렁였다. 한숨소리가 가득했다. 노인들은 혀를 찼다. 몇몇의 아낙네들은 흐느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사제들은 눈치를 주며 호통 쳐 주변을 조용하게 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새어나오는 탄식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리라.
사람들의 시선 끝에는 소녀의 티를 막 벗은 젊은 여성이 있었다. 여성은 온 몸에 멍이 들고 상처 입은 채 나무 기둥에 손발이 묶여 있었다. 여성, 붉은 머리의 마녀 아리아는 두 눈을 부릅떴다. 이윽고 고개를 돌려 자신의 양 옆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일찍이 자신보다 먼저 불에 탄 나무 기둥이 서 너 개 더 있었다. 묶여있는 것은 모두 형을 집행 받은 마녀들, 아니 마녀였던 것들이었다. 아리아는 씹어뱉듯이 말했다.
“자비 좋아하네. 이 광신도들아. 나는…우리는 죄가 없어!”
“마녀들은 다들 그렇게 말하지.”
프란시스는 조소했다. 사제들의 손에 의해 마른 짚단과 나무 장작더미가 아리아의 발치에 차곡차곡 쌓였다. 프란시스가 다른 사제들에게서 받은 횃불을 하늘로 높이 들어올렸다. 어둑한 하늘에는 날카롭고 차가운 초승달이 빛나고 있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집행이니만큼 특별히 마녀의 죄를 씻을 기회를 넘겨주겠다. 누군가, 이 횃불을 마녀에게 던질 자가 있는가? 한 점의 죄도 없이 당당한자 말이다!”
프란시스의 우렁찬 외침이 광장에 퍼졌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의 두 눈에는 공포와도 같은 것이 서려있었다. 프란시스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렸다. 프란시스는 이내 송곳니를 드러낸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왜들 그러지? 혹시 이 마녀에게 현혹된 자가 아직 더 남았단 말이냐? 아직 기둥에는 몇 자리가 남아있다만.”
기사들이 허리춤의 검 집에 손을 올렸다. 철커덕거리는 금속 소리가 적막한 가운데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주춤거리며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프란시스는 횃불을 쥐지 않은 오른손을 어깨까지 들어 올려 기사들을 제지시켰다.
“하기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모두 살아가며 죄를 짓는 것을. 사제인 나조차도 말이다. 그래, 내가 말을 잘못했군.”
기사들의 태도가 누그러지자 사람들의 눈에 어렴풋이 희망이 서리는 것이 느껴졌다. 프란시스의 관대한 언동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자도 있었다.
“하지만 주께서는 말씀하셨다. 천국은 어린 자들의 것, 어린아이와 같이 무구한 자들이야말로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자다!”
프란시스는 오른 손을 쭉 뻗어 군중들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이제 막 예닐곱 살이 됐을 법한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중년 여성의 치마폭 사이에 숨어 덜덜 떨었다. 프란시스는 천천히 소녀에게 다가갔다. 소녀와 그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성을 좌우로 하여 군중들의 간격이 크게 벌어졌다. 횃불에 비추는 프란시스의 얼굴이 아지랑이처럼 일렁였다. 이 젊은 사제는 자비심마저 느껴지는 미소를 지었다.
“자, 꼬마 아가씨. 할 수 있지?”
프란시스의 목소리는 겁먹은 아이를 다독이는 아버지처럼, 그 누구보다도 다정했다. 상냥하게 내밀어진 손에는 소녀의 상반신만한 횃불이 들려있었다. 소녀는 머뭇거리며 작은 손을 뻗었다. 그러나 가느다란 팔은 허공을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어서 받으렴. 하늘에 큰 상급을 쌓을 기회란다.”
프란시스가 한 손으로 소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프란시스 사제님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니까―, 다른 사제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소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소녀의 가녀린 어깨를 쥐고 있는 중년 여성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듯 했다.
“그만둬! 저주받을 놈들아! 지옥에나 떨어져라! 모두 죽어버리라고!”
마녀 아리아가 양손에 묶여있는 밧줄을 풀려는 듯이 크게 몸부림치며 울부짖었다. 거친 밧줄에 살이 쓸리고 피부가 벗겨져 피가 배어 나왔다.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킨 기둥이 크게 흔들렸다. 모든 것이 소란스러웠다. 사제들이 성호를 그리며 기도문을 읊기 시작했다. 기사들이 갑옷소리를 내며 바삐 움직여 기둥을 고정시켰다. 아리아는 계속해서 비명과도 같이 절규했다. 갖은 고문과 모욕에도 평정심과 초연함을 잃지 않았던 아리아였다. 이 무의미한 광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집행하겠습니다. 프란시스 사제.”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프란시스의 커다란 두 눈이 더욱 커다랗게 뜨였다.
“오오, 과연 처녀의 아들, 가스펠 사제님! 아주 좋습니다!”
프란시스는 소녀에게 주려고 했던 횃불을 거두어 내게로 가져왔다. 나는 그를 가만히 멈춰 세웠다. 그리고 꽉 쥐고 있던 오른손의 주먹을 펴 손바닥을 위쪽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작은 탄식을 내뱉으며 숨을 들이켰다. 사제들과 기사들 중 몇은 경탄하기까지 했다.
“이것이 그 신성한…! 정말 놀랍습니다! 모두들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신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하십시오! 아아, 일개 마녀가 받기에는 지나치도록 과분한 은총이로구나!”
오오, 영광스럽도다! 프란시스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의 하얀 장갑 위로 자그마한 푸른 불꽃이 일렁였다.
“그, 그만둬!”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날뛰던 아리아가 소리쳤다. 내게는 모든 것이 익숙한 광경이었다. 나는 언제나처럼 나직하게 말했다.
마녀 아리아, 너에게 죄가 없다면 살아남을 것이다
나의 가장 낡고 오래된 기억은 거대한 불꽃이었다. 그 날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짐승의 비명과도 같은 여인들의 울음소리, 검과 갑옷들이 절그럭거리는 차가운 쇳소리, 누군가 반복하여 읊는 기도문들, 무언가가 폭발하는 파열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둑한 밤하늘을 향해 나무 기둥들이 자꾸만 솟아올랐다. 하늘에는 날카롭고 차가운 초승달이 기분 나쁜 비웃음처럼 떠 있었다. 생물이 타들어가며 내뿜는 매캐하고 야릇한 냄새가 내 코를 간질였다. 그때도 나는 누군가에게 불을 놓았다.
그 때의 나는 몇 살이었을까. 이렇게 푸르른 불꽃을 보고 있노라면 그 날의 기억이 더욱 생생해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다음화 : 1 장 –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장편의 첫 서장입니다. 완결을 낸 후 탈고를 하고 쓰는 것이 아닌 부분적으로 써낸 후 글을 올리는 것이기에 상당히 미숙하고 조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재미있게 읽어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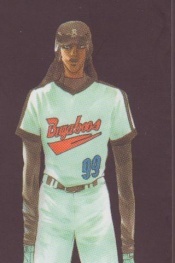
 추천
추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