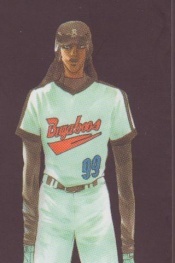산문 느낌의 시 모음
당신을 사랑할 때 그 불안이 내겐 평화였다. 달빛 알레르기에 걸려 온몸이 아픈 평화였다. 당신과 싸울 때 그 싸움이 내겐 평화였다. 산산조각 나버린 심장. 달은 그 파편 중의 일부다. 오늘 밤 나를 만나러 오는 당신의 얼굴 같고. 마음을 열려고 애쓰는 사람 같고. 마음을 닫으려고 애쓰는 당신 같기도 해. 밥을 떠 넣는 당신의 입이 하품하는 것처럼 보인 날에는 키스와 하품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였지. 우리는 다른 계절로 이주한 토끼처럼 추웠지만 털가죽을 벗겨 서로의 몸을 덮어주진 않았다. 내가 울면 손을 가만히 무릎에 올려놓고 침묵하던 토끼.
당신이 화를 낼 때 그 목소리가 내겐 평화였다. 달빛은 꽃의 구덩이 속으로 쏟아진다. 꽃가루는 시간의 구덩이가 밀어 올리는 기억이다. 내 얼굴을 뒤덮고 있는 꽃가루. 그림자여, 조금만 더 멀리 떨어져서 따라와 줄래? 오늘은 달을 안고 빙글빙글 돌고 싶구나. 돌멩이 하나를 안고 춤추고 싶구나. 그림자도 없이.
/박서영, 달의 왈츠
가도 가도 눈이었다. 당신은 나를 영원히 바라보았다. 나는 언덕을 오르다 돌을 줍기도 했다. 주운 돌을 주머니에 넣고 가도 가도 눈이었다. 우체국에서 우표를 사기도 했다. 숲 속에서 검은 잎을 줍고 가도 가도 눈이었다. 강에 나가 오리를 셌다. 노랑턱멧새를 만나기도 했다. 당신은 참 좋다고 했다. 당신은 미안하다고 했다. 가도 가도 눈이었다. 가도 가도 눈이었다.
나는 당신의 계단을 오른다
/이준규, 계단
내가 바라볼 때면 너는 어김없이 작아진다. 아프리카의 해는 아프리카의 하늘 아래. 괄호의 심장은 괄태충의 어둠 속에 있다. 종이꽃을 뿌리자. 종이꽃을 뿌리자. 이제 너는 금발의 초원이 된다. 개미굴을 여행하던 날들은 어제속으로. 어둠을 묻던 날들은 기억 속으로. 숲은 자란다. 숲은 자란다. 공원의 아이들이 듣는 것은 안테나 집시송. 올리브 나무 사이로 보는 것은 글로리아의 아침. 기적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기적은. 바닥에서 시작해서 바닥으로 끝나는 꿈. 단어에서 시작해서 단어로 끝나는 꿈. 모나카는 모나카의 사각으로. 기적은 기적의 심장으로. 펄럭인다. 펄럭인다. 고통의 날개. 고통의 깃발. 너의 눈동자를 두 번 건너뛴다. 헝겊 인형의 심장을 두 번 두드린다. 북소리가 좋아 북소리를 듣는다. 언제나처럼 구겨진 채로 떠내려갔다 떠내려온다. 복숭아 같은 다정함이 우리를 부른다.
/이제니, 기적의 모나카
어슴푸레한 빛. 불 켜진 방은 환하다. 쓰레기차가 지나간다. 귀뚜라미 소리는 없다. 빗소리도 없다. 파도 소리 같은 자동차 소리가 들린다. 그곳의 파도 소리를 녹음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후회는 쌓인다. 후회는 후회를 잊는다. 후회는 후회를 쌓는다. 새소리가 요란해진다. 피아노 소리 들린다. 마루에서 부엌까지 걸어가면서 메조스타카토의 적당한 길이를 생각했다. 적당은 없었지만 적당은 있었다. 물을 끓인다. 과테말라 21g. 눈물 날 정도로 맛있는 커피. 그와 나는 마주 보고 앉아 있었다. 서로의 마음을 안다는 듯 마주 보고 있었다. 착각과 거짓만이 유일한 희망 같기도 했다. 아니 그런 건 없다. 그럴 것이다. 오늘 쓴 문장 어디에도 아름다움은 없다는 너의 문장은 아름다울 것이다. 환해진다. 이젠 첼시 호텔을 들어도 별로 첼시 호텔에 가고 싶지 않다. 단지 어떤 감각들. 흐려지며 분명해지는 것들. 죽은 사람이 벚나무 아래를 지나간다.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는 봄에도 장갑을 꼈다. 장갑 낀 손으로 커피 잔을 들고 담배를 피우고 무언가를 적었다. 그를 기억한다. 물을 끓인다. 케냐 22g. 눈물 날 정도로 맛있는 커피. 안녕, 잠에서 나온다. 안녕, 잠으로 들어간다. 미명과 사양을 착각한다. 부서지는 웃음. 환하게 환하게. 선데이 모닝을 듣는다. 아침의 선물. 아침의 속도. 불안한 숨을 몰아쉬는 나의 숲. 이를 닦는 너의 숲. 우리들의 결정적인 숲. 우리들의 불가능한 숲. 이런 아침에 우리라는 단어를 고민하고 싶지 않다. 잠과 잠 밖에 해가 있다. 젖은 목소리를 말린다. 목소리 안의 목소리. 목소리 밖의 목소리. 목소리가 쌓인다. 벽면의 그림자가 어둠을 닫는다. 서쪽에는 그가 살고 있다. 눈물 나게 아름다운 그가 살고 있다.
/박지혜, 아침
그렇게, 네가 있구나 하면 나는 빨래를 털어 넣고 이불 구석구석을 살펴본 그대로 나는 앉아 있고 종일 기우는 해를 따라서 조금씩 고개를 틀고 틀다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오는 방향으로 발꿈치를 들기도 하고 두 팔을 살짝 들었다가 놓는 너가 아니 너와 비슷한 모양으로라도 오면 나는 펼쳤다가 내려놓는 형편없는 독서 그때 나는 어떤 손짓으로 어떻게 웃어야 슬퍼야 가장 예쁠까 생각하고 그렇게 나, 나, 나를 날개처럼 접어놓는 너 너 너의 짓들 너머로 어깨가 쏟아질 듯 멈춰놓은 모습 그대로 아니 그대로, 멈춰서 멈추질 멈췄으면 다시처럼 떠올려 무수히 많은 다시 다시 와 같이 나를 놓고 앉아 있었으면 나를 눕히고 누웠으면 그렇게 가만히 엿보고 만지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의 밋밋한 한 곳을 가리키듯 막막함이 그려져 손으로 따라 걸어 들어가면 그대로 너를 걸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숨이 타오름이 재가 된 질식이 딱딱하게 그저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그건 너가 아니고 거실, 나는 네 눈 뒤에 서 있어서 도저히 보이질 않는 너라서 미로를 폭우 쏟아져 내리는 오후처럼 기다려 이를 깨물고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물고 어떻게 그러므로, 너로부터 기어이 너가 오고
/유희경, 너가 오면
사각사각 연필을 깎아서 사각을 향해 걸어들어가면 고개를 아무리 돌려도 볼 수 없는 배면과 만나겠지 우리는 한 장 종이의 앞뒤로 이어져 각각의 자리에서 각자의 연필로 적어내려가는 거야 잠시 내비치지만 이마를 짚어 볼 수도 있지만 점점 다른 쪽으로 향할 거야 쓸수록 멀어질 거야 결말이니까 뒤집을 수 없으니까 그만하자, 그런 말도 그만하자 의미를 찾고 싶겠지 알고 싶겠지 지친 호흡기를 떼어내는 손처럼 말라버린 뿌리를 들어내는 삽처럼 시한이 다해 가는 마침표를 위해 드라마틱한 까닭이 필요하겠지, 그러나 이것은 거대한 그림 멀리 가서야 알 수 있는 것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보아야 하는 것 너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용에 뒤섞여 언제까지나 맥락이 없구나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구나 사랑을 참 헤프게도 쓰는구나 대답을 먼저 하고 문제를 알아맞힐까 대답이 불가능한 문제를 찾아볼까 증명을 위해 생을 탕진할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거나 말거나 달라지지 않을 텐데 글자마다 페이지를 파고들다니 이면의 희미한 요철을 따라 반만 남은 영혼들이 창밖을 내다보는데 창밖은 언제나 바싹 달라붙게 쓴다, 마음속도 언제나 달라붙게 이렇게나 가까워서 속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너에 대해 더는 쓸 수가 없겠어
/김박은경, 파본
썩은 달이 지고 징그러운 아침이야, 애인아. 바람을 신으로 모신 버드나무가 미동도 않고 신을 기다리고 쓰레기봉투를 쪼던 까치는 포클레인에 앉아 꽁지를 까닥거리고 있어. 단추알만한 까치의 눈 속에서 번뜩이는 건 그래, 벌레 같은 여름 태양이야.
난 아침이면 이런 생각을 해. 이마에서 수십 개의 뿔이 돋아도 즐겁다, 즐거워야 한다, 뭐 이런…… 안심해. 미치지 않았어. 최소한 네 앞에서는. 피곤할수록 눈동자가 살아나. 너에게서조차 위로의 속삭임이 오지 않으니 난 자주 눈알을 뽑아버리고 싶어.
거울을 빠개는 태양. 뽑지 않아도 저절로 눈알이 녹을 거야. 태양을 떨어뜨리고 싶어. 내 머릿속에 손을 넣어줘. 물파스를 발라줘. 부탁인데 입은 좀 다물어줘. 난 열린 문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난 순한 것은 즐기지 않아. 자백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아.
자면서도 다 듣는 애인아. 우린 썩은 이마를 맞대고 살아온 거야. 날개라고 알고 있었지만 등 뒤에서 나온 건 새싹이었어. 그러니까 우린 열매였던 거지. 더 썩을 일도 없이 썩은…… 혹시 넌 곰팡이를 키우면서도 누군가를 기다리니? 나 아닌 누군가를?
귀에서 한 바가지씩 물이 쏟아지는 요즘은 너도 의심스러울 거야. 살아 있긴 한 건가. 우린 너무 오래 함께 있었어. 같이 있어도 혼자인 우린 사라져도 사라지는 게 아니게 된 거야. 우린 이제 창자를 꺼내 심어도 서로에게 뿌리내릴 수 없어.
꿈에서라도 지붕을 뚫고 떠나. 썩은 생각만을 감싸는 두피 따위는 벌레에게나 떼어줘버려 외로움이 길면 면도날이 없어도 스스로를 해체하는 날이 와. 그러니 애인아, 엎드려 신께 경배하자. 드디어 우린 상처 없이 함께할 수 있게 됐어. 할렐루야.
/김개미, 너보다 조금 먼저 일어나 앉아
암호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나는 다리가 꺾인 짐승처럼 빙 돌아와 말했다. 아 파 요. 간격을 두고 마디마다. 몸이 찢어진 벌레들 위에 누운 언니는 숨겨진 것들의 작은 아픔을 욕망했고, 핀셋을 들어 관찰했다. 때때로 나는 공포를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나의 내장에 기생하는 벌레들을 상상했다. 우리는 무력함에 대해 생각했다. 나의 욕망은 너의 아픔보다 중요한 일일까. 너와 나는 우리를 자세히 훼손했다.
눈물이 많아요.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고 배경이 되고 단역이 되고. 어두운 커튼으로 내려앉아 불빛으로 새어 나가고. 우리의 날 속에 쳐진 얇은 막이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는 서로를 파괴할 때 더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얇고 견고하고 위태롭고 많은 단어의 색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나는 파괴될 때 더 아름다웠고, 우리의 사랑은 충분히 병들어 있었다.
모두 벼를 쫓아 밤이 되길 기원했다. 그는 한 가지 꼭 원하는 것이 있어 삶이 무거웠고,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이 있어 삶이 무서웠다. 그는 매일 밤마다 꿈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랑해. 나는 우리가 굶주림에 지쳐 서로를 뜯어 먹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앓았다. 나의 한 쪽이 무섭게 병들어가고 있었다.
/조혜은, 우리
당신 생각을 또 했지 당신이 점점 커졌지 방문을 열 수 없었지 팔꿈치가 문에 걸릴까봐 정수리가 전등에 닿을까봐 창을 열 수 없었지 누군가 알아챌까 봐 그 틈에 창밖으로 당신 발가락이라도 빠져나갈까 봐 내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았지 당신은 자꾸 커졌지 갑갑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지 그만 커지라고 소리쳤지만 당신에게는 들리지 않았지 내 손짓도 보이지 않았지
지금 누가 이 생각을 하는 걸까 당신 생각은 절대 않겠다는 내 속의 무엇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걸까 왜 날개에 올빼미 눈 모양을 그리고 뭔가 보는 처 어딘가로 날아갈 수 있는 척하고 있는 걸까 마음은 침봉에 꽂힌 것처럼 옴짝달싹도 못하면서 당신의 코트 빛으로 얼굴은 물들어 버린 채, 이러다가는 모든 게 다 끝장일 거라는 생각 속에 당신을 또 집어넣고 있는 걸까
식물 조각가 스다 요시히로는 스스로에게 물었지 목련나무를 깎아 나팔꽃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목련인가 나팔꽃인가 당신을 내 마음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당신일까 나일까
/김박은경, 당신의 코트 빛으로 얼굴은 물들어버린채
발끝을 힘껏 들고 높은 곳을 더듬어 충분히 붉은 것들을 맛보았어. 입가를 온통 물들인 채 한 쌍의 유두가 된 기분으로.
언니, 우린 분명히 교묘히 어긋난 한 사람일 거야. 딸기의 어수선한 초록 왕관을 쓰고 이불 속에서 첫 몽정을 말하던 아침. 땀구멍마다 질긴 씨를 하나씩 슬어놓으며 우리는 함부로 은밀해지고 조금씩 말랑해졌지. 반투명 젤리 속 일렁이는 둘만의 왕국에서.
나에게 여분의 계절이 있다면. 부리가 사라지려는 새처럼 서둘러 속된 말들을 속삭이고 썩기 직전의 가장 달콤한 노래를 언니에게 선물했을 텐데. 분홍만으로 이루어진 무지개를 뭉개고 죄의식의 묘한 기쁨으로 아침의 올빼미를 불러올 텐데.
손가락 사이로 달고 끈적한 것들이 흘러내릴 때 감춰야 할 것이 늘어버린 마음으로. 한 개의 입술이 더 있었다면, 한 쌍의 얇은 점막이 더 있었다면, 뒤섞이며 짙어지는 맛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그저 길게 두 팔을 벌리고 옛붉음을 겪었지. 우리가 아직 숨겨진 단것을 사랑하던 그때.
/이혜미, 딸기잼이 있던 찬장
내가 아는 밑바닥이 있다. 물이 가득한지. 나는 한 번씩 떨어진다. 물에 젖어 못 쓰게 되는 노트. 집에는 빈 노트가 너무 많다. 떠날 수가 없네. 밑바닥이 들어 있다. 자꾸만 가라앉지. 어디도 내 집은 아니지만. 첨벙거리며 잔다. 베개가 둥둥 떠내려간다. 괜찮아. 어차피 바닥이라 다시 돌아와. 그가 이마를 쓰다듬어준다. 그는 손이 없고 나는 머리가 없지만 침대는 둘이 누우면 꽉 찬다. 투명해질수록 무거워지는 침대 빈 노트 빽빽하게 무엇이든 쓰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 무너지는 창문 밑에서 나는 썼다. 늘 물에 젖었다. 알아볼 수 없어서 너무 행복하구나,라고 헐떡거리기도 했다. 한 번씩 떨어져서 내 부로 들어가 본다. 여럿이 함께 잠들면 더 고요하고 적막해서 무서웠지. 그 사이로 물결 소리가 난다. 죽은 그가 아직도 책상에 엎드려 있다. 너는 모든 것을 쓰기로 했어. 나에게 보낸 편지처럼. 모든 것을 낱낱이 쓰기로 했지. 하지만 아무리 써도 채워지지 않는 물속 아무리 쌓아도 그것은 언제나 사라진다. 한심한 놈. 죽은 그가 중얼거리며 나를 본다. 물이 뚝뚝 떨어진다. 떠날 수가 없구나. 나는 너의 신발을 썼다. 무거워서 다시 신을 수가 없는데 나느 자꾸만 신발장에서 쓴다. 한 번씩 들어오는 내부라니. 문을 닫지 못해서 무엇이든 흘러간다. 비밀은 제대로 쓰이는 법이 없이. 쓸 수 없어서 조금씩 마모되는 것. 죽은 그가 나를 통과해 걸어간다. 부식되어가는 발로 걸어간다. 아무것도 쓰지 못해서 너는 이곳에 도달할 수가 없어. 진창에서 잠만 자는 너는, 그의 목소리가 멀어진다. 나는 그의 신발을 신고 있다. 둥둥 떠내려간다. 밑바닥에는 모든 것이 돌아올 텐데.
/이영주, 여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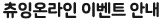 이벤트쓰
[04월4주차] 유니크뽑기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참여하기]를 누르시면 비로그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유니크당첨 기회를 노려보세요!
이벤트쓰
[04월4주차] 유니크뽑기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참여하기]를 누르시면 비로그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유니크당첨 기회를 노려보세요!